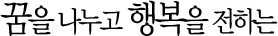경계 모호한 요양원·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시급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9 09:23 조회824회 댓글0건본문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 경계는 모호한 실정이다. 돌봄보다 치료를 하는 요양원, 치료보다 돌봄에 치중한 요양병원 탓에 환자 안전이 위협 받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 두 기관간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원은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노인이 치료보다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곳이다. 노인성 질환을 앓더라도 의료진의 관찰이 매일 필요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질환자’를 위한 곳이어서 2주에 1번 촉탁의가 방문해 건강을 관리한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한 의료시설로 ‘치료’가 목적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큰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거나 중증 만성질환자 등이 이용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픈 노인’들이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요양원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양병원 환자 평가표를 요양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요양원 입소자 3명 중 1명 가량(30.4%)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라고 추정했다. 실제 서울 용산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현재 시설 입소자 중 절반이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인데 음식을 삼키지 못해 일명 ‘콧줄(L-TUBE)’을 꽂고 있는 등 전문 간호인력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입소 기준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증인 3~5등급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야 요양원 이용이 가능한 반면, 중증인 1, 2등급은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중증 노인들은 요양원으로, 반대로 굳이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요양원 입소 자격이 안돼 요양병원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돌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돌봄을 받는 ‘사회적 입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이용자 중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 기능 저하군’은 2014년 4만3,439명(전체 요양병원 이용자의 8.8%)에서 2016년 5만8,505명(10.8%)으로 늘었다. 이 기간 이들이 사용한 건보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도 2,087억원에서 3,49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환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환자 중증도에 따라 입소기관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과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맞물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이용자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입소ㆍ입원 규정을 명확히 하되 돌봄과 의료가 모두 필요한 노인에게도 알맞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노인들의 의료욕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뿐 아니라, 일본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노인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에 요양병원의 역할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제외돼 간극이 커진 것”이라며 “8월말까지 제도적으로 재설계할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일보, 2018.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