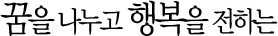원전과 태양광은 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7 11:12 조회1,114회 댓글0건본문
제각기 장단점 있어 유일한 대안 될 수 없는 게 현실
정치적 여론 몰이보다 기술 경쟁으로 효용 입증해야
10여년 전 한국전력은 중국 정부가 서해안에 짓는 원전 사업에 입찰했다. 중국 측은 까다로웠다. 이래저래 한전에 요구한 서류가 트럭 두 대 분에 달했다. 그럼에도 어렵게 진행되던 협상은 미국에서 날아온 팩스 한장 때문에 갑자기 중단됐다. 팩스 내용은 단 두 줄. ‘한전이 중국에 짓는 원전과 관련해 미국이 특허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로 한전은 두 손을 들어야 했다. 원전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는 대부분 미국 에너지부가, 실용기술에 대한 특허는 웨스팅하우스 등 일부 기업이 갖고 있다. 그러기에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은 제대로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 미국의 원천기술로 개발한 무기를 우리가 제3국에 함부로 수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기술 독립 말고도 원전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방사능을 내뿜는 폐기물과 사고 위험이다. 핵 폐기물을 지구 어딘가에 버려야 하는데 70억 인구를 피할 장소를 찾는 게 매우 어렵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원전 강국도 아직 고준위 핵 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후쿠시마처럼 사고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다. 이런 면에서 원자력은 아직 미성숙 에너지다.
그렇다고 신재생, 특히 태양광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를 ㎾h당 170~180원에 사주고 있다. 이를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h당 100원 정도에 판다. 그 차액은 정부 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경제성이 있는 수준(Grid Parity)은 아직 먼 미래의 얘기다. 땅도 문제다. 1㎿짜리 하나 짓는 데 1만2000㎡가 필요하다. 친환경 에너지에 힘을 쏟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전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도 국토 난개발 우려 때문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품질도 문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 건 고품질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 정도 능력을 갖추려면 시간과 돈이 아주 많이 든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30년 전기의 20%를 신재생으로 공급한다는 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전보다 144조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추계했다.
결국 원전도 태양광도 완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하지만 둘엔 긍정적인 큰 공통점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에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다. 기술 개발 가능성도 풍부하다. 원자력 분야에선 핵융합 에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폐기물 걱정이 훨씬 덜한 모듈형 원전이 개발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열효율은 10여년 전 10%에서 최근엔 18%로 급속히 높아졌다. 둘 다 미래의 에너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관건은 기술일 수밖에 없다.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값싼 에너지가 되기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선 정치가 기술을 앞선다. 원전업계에선 태양광을 ‘이념의 에너지’라 부른다. 정부 정책에 업혀 손쉽게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업계에선 원전업계를 ‘기득권 에너지’라고 공격한다. 신재생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려 한다고 의심한다. 그러면서 과학적 팩트보다는 여론몰이와 루머로 분위기를 잡으려 한다.
이런 모습으론 미래 에너지 강국을 기약할 수 없다. 원자력과 태양광은 적이 아니다. 최선의 에너지원을 둘러싼 경쟁자일 뿐이다. 경쟁의 수단이 시위나 집단 행동이 아닌 기술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도 ‘2030년 재생 에너지 20%’라는 식으로 섣불리 나서선 곤란하다.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두 에너지가 각자 최선을 다해 기술과 시장성을 높이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쩌면 에너지 정책은 골대가 움직이는 축구 경기와 같다. 미래의 판도가 바뀌면 현재의 전략과 전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은 유연한 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출처: 중앙일보2018.10.8] [서소문 포럼;나현철]
그날로 한전은 두 손을 들어야 했다. 원전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는 대부분 미국 에너지부가, 실용기술에 대한 특허는 웨스팅하우스 등 일부 기업이 갖고 있다. 그러기에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은 제대로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 미국의 원천기술로 개발한 무기를 우리가 제3국에 함부로 수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기술 독립 말고도 원전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방사능을 내뿜는 폐기물과 사고 위험이다. 핵 폐기물을 지구 어딘가에 버려야 하는데 70억 인구를 피할 장소를 찾는 게 매우 어렵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원전 강국도 아직 고준위 핵 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후쿠시마처럼 사고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다. 이런 면에서 원자력은 아직 미성숙 에너지다.
그렇다고 신재생, 특히 태양광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 에너지를 ㎾h당 170~180원에 사주고 있다. 이를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h당 100원 정도에 판다. 그 차액은 정부 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경제성이 있는 수준(Grid Parity)은 아직 먼 미래의 얘기다. 땅도 문제다. 1㎿짜리 하나 짓는 데 1만2000㎡가 필요하다. 친환경 에너지에 힘을 쏟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전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도 국토 난개발 우려 때문이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품질도 문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한 건 고품질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이 정도 능력을 갖추려면 시간과 돈이 아주 많이 든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030년 전기의 20%를 신재생으로 공급한다는 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전보다 144조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추계했다.
결국 원전도 태양광도 완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하지만 둘엔 긍정적인 큰 공통점이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에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다. 기술 개발 가능성도 풍부하다. 원자력 분야에선 핵융합 에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폐기물 걱정이 훨씬 덜한 모듈형 원전이 개발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열효율은 10여년 전 10%에서 최근엔 18%로 급속히 높아졌다. 둘 다 미래의 에너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관건은 기술일 수밖에 없다.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값싼 에너지가 되기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선 정치가 기술을 앞선다. 원전업계에선 태양광을 ‘이념의 에너지’라 부른다. 정부 정책에 업혀 손쉽게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업계에선 원전업계를 ‘기득권 에너지’라고 공격한다. 신재생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반대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려 한다고 의심한다. 그러면서 과학적 팩트보다는 여론몰이와 루머로 분위기를 잡으려 한다.
이런 모습으론 미래 에너지 강국을 기약할 수 없다. 원자력과 태양광은 적이 아니다. 최선의 에너지원을 둘러싼 경쟁자일 뿐이다. 경쟁의 수단이 시위나 집단 행동이 아닌 기술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도 ‘2030년 재생 에너지 20%’라는 식으로 섣불리 나서선 곤란하다.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두 에너지가 각자 최선을 다해 기술과 시장성을 높이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쩌면 에너지 정책은 골대가 움직이는 축구 경기와 같다. 미래의 판도가 바뀌면 현재의 전략과 전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은 유연한 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출처: 중앙일보2018.10.8] [서소문 포럼;나현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