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d 스페셜/교육] 아이 高, 벗어날 수 없는 ‘수저의 굴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2 09:49 조회962회 댓글0건본문
E고교는 이른바 ‘문제아’ 학교로 불린다. 비평준화 지역에선 중학교 성적 등으로 고교에 진학한다. E고교에는 인근 지역 모든 일반고에 떨어진 학생들이 집결한다. 학생 상당수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기도 하지만 유흥비를 마련하려는 학생이 많다. 학교 수업 시간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기피 학교에 몰리는 저소득층 학생들
국민일보는 교육 당국 등의 협조를 받아 경북과 충남에서 비평준화 지역 한 곳씩을 골라 교육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봤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에 교재비·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다. 중간 소득의 절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2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비평준화 지역은 고교 서열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학생 비중이 높았다.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진학 유형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E고교는 부모의 든든한 후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유독 많다.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학생은 10명 중 4명꼴이다. 반면 지역 명문으로 통하는 A고교는 3.8%만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이 지역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13% 수준이다. E고교에는 저소득층이 지역 평균보다 3배 많고 A고교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고교를 비교하면 10배가량 차이가 벌어진다. 학력 대물림의 또 다른 단면이다.
충남의 비평준화 지역도 마찬가지다. 교육급여 수급자 비율이 확인된 고교 8곳 가운데 F고교가 이 지역에서는 학부모 선호도 1위였다. 일반고지만 다른 시·도의 자율형사립고 못지않은 대입 실적을 자랑하며 서울대 입학생도 매년 꾸준하게 나온다. F고교의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0.8%에 불과했다. F고교와 쌍벽을 이루는 G고교 역시 2.3%에 그쳤다. 2순위 고교에 해당하는 두 고교는 각각 5.4%, 5.9%였다. 3순위 고교 두 곳은 10.1%, 10.4%였다. 선호도가 가장 낮은 직업계고 두 곳은 15.6%, 16.7%로 조사됐다. 선호도가 높을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낮았고, 선호도 일등과 꼴등의 격차는 20배를 넘었다.
‘진로 미정’ 2만여명 매년 쏟아져
기피 학교에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학 진학률과 교육급여 대상자 수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전국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교육 양극화를 실증하는 데이터지만 학교 평판 등을 고려해 만들거나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다.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 고교 졸업장만 받고 아무 대책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일반고 졸업생은 매년 2만여명 수준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기술이라도 배워서 나오지만 일반고 졸업생은 대책이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고 3학년은 총 43만7299명이었다. 이 가운데 40만4155명이 대학에 입학했거나 재수를 하고 있다. 1만454명은 군대에 가거나 취업했다. 나머지 2만2690명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이 졸업 후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무엇을 하는지 정부도 추정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자녀도 저학력에 이은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동의한다. ‘고소득층→명문대→엘리트→고소득층’ 반대편에 ‘저소득층→저학력→저임금 노동→저소득층’ 순환 고리가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고교 1학년부터 방과 후, 방학, 주말 등을 활용해 예비 직업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적어도 학교에서 엎드려 잠만 자다 대책 없이 졸업하는 상황만은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예비 직업과정은 제과제빵, 에너지 융합설비, 바리스타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효과는 미지수다. 교육부뿐 아니라 보건복지, 여성가족, 노동 등이 유기적으로 학생 환경을 바꿔줘야 교육 격차가 해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 직업과정 시범학교에선 학생 표정이 밝아지고 잠을 자는 학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고교 단계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아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는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유치원부터 양극화… 저소득층 민간어린이집 vs 고소득층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도입 격차는 완화됐지만 어린이집은 보육 중심이 현실
사교육 못 받는 초등생은 학습 결손
상급 학교 진학할수록 만회 힘들어
교육 격차는 유아 때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학년과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격차가 커지다가 고교 단계로 가면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진다. 공부에 흥미를 잃어 엎드려 자는 학생을 되돌리긴 쉽지 않다. 따라서 성장 단계별로 격차를 줄여주는 시의적절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민간어린이집, 고소득층은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공립유치원은 경쟁이 치열하고, 사립유치원은 비용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60만6280원이었다. 민간어린이집 평균인 63만4476원의 4배 수준이다. 국공립유치원은 13만7376원인데 추첨에서 떨어진 저소득층 학부모는 사립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정 52.9%가 민간어린이집, 16.0%가 사립유치원을 보낸다. 500만원 이상 가구는 민간어린이집 27.1%, 사립유치원 42.3%다.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육 격차는 완화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여전히 보육 중심이어서 유치원과 격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국공립유치원 원비 수준으로 비용을 낮춘 사립유치원이다.
초등학교 단계부터는 학습 결손이 나타난다. 교사가 다수 학생을 가르치다보니 학습 진도 나가는 데만 급급하게 된다. 교사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교육 받는 학생은 문제없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모르는 내용이 쌓인다. 상급학교로 진학해 내용이 어려워지면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중학교 단계에서 만회하지 못하면 고교에 가서는 더욱 힘들어진다. 고교 교육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된 구조다. 학생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긴 해도 진학한 학교의 환경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
저소득층 학생이 이런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대입 레이스’를 마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부모의 지원이 넉넉하면 한두 번 실패해도 만회하기 어렵지 않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입 결과로 입증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에 다니는 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 자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역시 고소득층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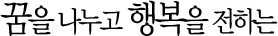

![[& And 스페셜/교육] 아이 高, 벗어날 수 없는 ‘수저의 굴레’ 기사의 사진](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7/0322/201703220502_11130923715091_1.jpg)



